아마도 이력서에 적지는 않겠지만 - 1. 말림비
이력서를 적으려고 하다 보니, 분명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력서에는 기록되지 않을 일들이 참 자잘하게 많다.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두려고 한다.
많은 이야기 중에도,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말림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저 유치하고도 올드한 이름은 2000년 가을에 시작해 2003년 어드매쯤 까지 내가 학교 내에서 운영했던 BBS의 이름이다.
2000년의 나는 지금 돌아보면, 트롤과 야생 원숭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학내에서 가장 큰 BBS였던 포스비(PosB)에 그렇게나 많은 글들을 도배하던, 천천클럽에 가입하겠다며1 아무 말을 쏟아내던 시절이었다. 결국,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분되지 않는 환경에서 여러 잡음(혹은 잔소리)이 들리기 시작했고, 나는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말림비의 시작이었다.
아직도 키즈, 아라, 과수원을 포함, 수많은 BBS을 기웃거렸던 일. 그러다 나리한마당에서 zmodem으로 소스파일을 다운로드하였던 순간을 기억한다. glibc버전차이로 제대로 컴파일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다 구버전의 리눅스를 찾아 무은재도서관에서 리눅스 책2을 빌리고, 처음으로3 부가자료대출을 신청해서 Redhat 5.2 CD를 받아들고 학생회관으로 가던 그 순간과 신문사의 방치된 75mhz 펜티엄 컴퓨터4에 리눅스를 깔고 BBS설치에 성공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던 일들도 기억난다. 지금이야 아무리 초보라도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은 일인데 시작에 몇주는 걸렸다. 그땐, 구글도 github도 없었다. CD를 굽거나 리눅스 배포판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어문서를 링크를 수십 번 눌러 찾아서 사전 찾아가며 읽던 그런 시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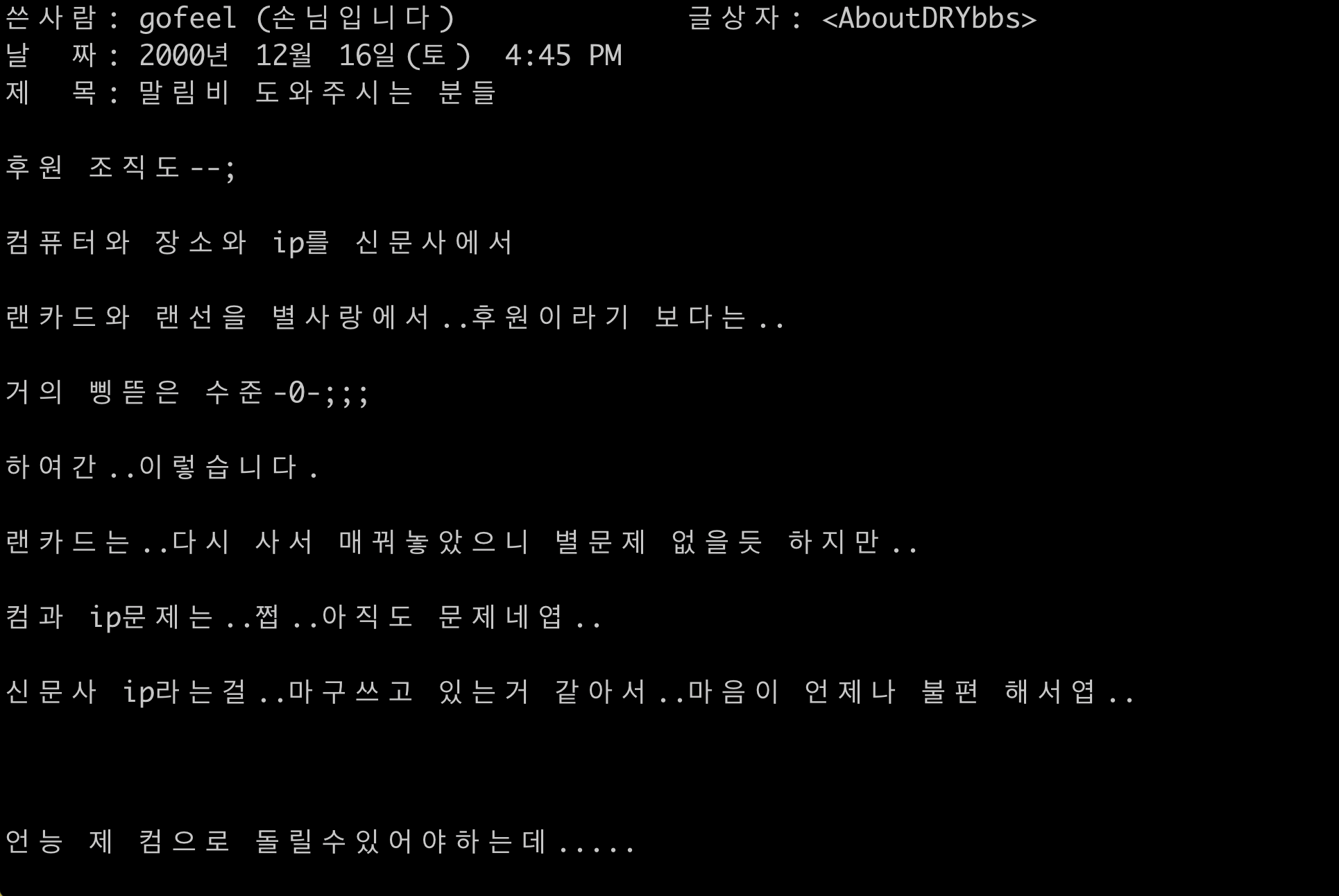
3개의 BBS만이 각 단체에 의해서 UNIX와 거기에 맞는 비싼 하드웨어 기반으로 돌아가던 학교에 1학년이 Linux기반으로 혼자 BBS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화제였다. 이상한 신입생에서 이상하고 개발 잘하는 신입생으로 바뀐 그 이미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쌓이고 쌓였고, 그것은 명성 혹은 악명이 되어 지금까지도 어떠한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덕에 수년간 잘 지냈고, 반쯤은 고생 중이다. 말림비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BBS 운영이라는 건 개발은 한 30% 그중에 대부분은 오래된 코드를 읽고 버그를 수정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덜 이뤄진 리눅스 포팅을 마무리하는 것과, 2 Byte 한글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것. 30%는 리눅스를 깔고 업데이트하는 시스템 운영, 그리고 나머지는 서비스 운영이었다.5 개발과 운영은 하나하나 언급하기엔 이젠 오래된 기술들이 되어 의미가 없어졌지만, 서비스를 운영했던 경험, 사용자의 바로 옆에 붙어서6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던 기억, 여러 상황들을 주변사람들과 논의하고 정책으로 혹은 코드로 반영했던 일은 지금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코드와 제품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사용자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배웠다. 다시 말하면 말림비는 내게 제품을 만드는 기쁨을 알려준 처음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적는 두 번째 이유다.
모든 것을 떠나, 나에게는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나만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 지를 배웠다.7 기술적인 문제를 푸는 것은 차라리 쉬웠다. 사용자의 심리에 대한 분석이라거나 도움을 받기 위한 협상 같은 것들을 몸으로 배웠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철학이 단단하지 않으면 위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흔들린다는 것을 배웠다. 제품 철학은 다시 문제 정의에서 나온다. ‘문제의 정의와 해결’ - 이 뻔한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흔치 않은 일인지 생각해 본다. 운이 좋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나는 문제의 정의와 이에 따른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것을 이때 배웠다.
말림비의 끝은 좀 싱거웠다. 어느 날 문을 닫았으니깐. 해킹을 당했고 서비스 영향은 별로 없었지만, 내가 불안한 단계에서 원인 해결이 어려웠던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기는 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해 왔건만, 어떤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덜 외롭고 덜 불안해져서 글을 덜 적게 되었고, 고학번이 되어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를 덜 듣게 된 것이 그러니깐 문제가 약간은 희미해진 것이 진짜 이유라고 지금은 생각한다.
최근에 읽은 “이와타 씨에게 묻다”에서 발견한 이와타 씨가 자신의 짝꿍이 첫 사용자였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며, 무작정 만든 제품의 첫 사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한다. 그때 그 시절 서비스를 쓰고 피드백을 주었던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또 미숙함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했다는 말로 이 이야기를 마친다.
Footnotes
-
로그인 1000회 & 글 1000개. 4월에 가입해서 약 100일만에 달성했던 것 같다. 하루에 로그인 10번 글 10개다. ↩
-
그리고 마지막으로 ↩
-
대충 이런 느낌의 컴퓨터였다. 하드는 500MB 정도.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68920&ismobile ↩
-
코딩은 거의 없었다. 여러 번 포팅된 C코드를 손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새로운 기능들은 모두 Perl w/CGI스크립트로 처리하곤 했었다. 그래서, “개발” 잘한다는 이미지에 대한 부담이 늘 있었다. ↩
-
식당이나 수업 가는 길이나 아니면 강의실의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누군가 나를 붙잡고 뭔가를 이야기 해주거나 내가 운영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이야기를 등 뒤로 듣기도 했다. 다시는 못할 경험이다. ↩
-
이 것은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많은 것들을 그리고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때 배웠다. ↩